Si-Fi 영화로 가장 강렬했고 충격적일 만큼 좋아했던 게 매트릭스(The Matrix)였다. 머신이 만든 허구의 가상세계를 깨닫고 그걸 벗어나고자 애쓰던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네오는 너무나 멋지기도 했지만, 그 주옥같은 대사들에 가슴 떨렸던 기억이 있다. 매트릭스 전 시리즈를 난 여러 번 봤는데, 지금도 가끔 다시 볼 때면 여전히 그때의 감흥이 생각난다. 당시 소장했던 DVD는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
매트릭스 영화 이전, 대학에서 내가 가장 재미있게 배웠던 과목 중 하나가 "사회계층론"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이름만 기억나는 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가 최초로 주장했던 개념이다. 난 "계층"에 대해 처음 배우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당연시해오던 이 사회를 깊숙히 들여다보면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자원에 따른 계층이 있고, 계층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배우며 난 사회학의 매력에 빠졌다. 그래서 한때는 사회학 박사를 꿈꾸기도 했었다.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풀린다...^^)
사회학을 전공했고 좋아한다는 내게 사람들은 내 이미지와 "사회학"이 잘 안 어울린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한번은 대학원에서 만난 어떤 친구가 자신이 봐왔던 사회학과 친구나 선배들은 교수님들과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으며, 사회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난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듯해 보인다고 했다. 우린 당시 그냥 아는 지인 사이였기 때문에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날 잘 모르는 체 그런 얘기를 하는 그녀에게 크게 반박하지 않았다.
어떤 공부를 하는데 있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단 내가 이해하는 사회학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무엇인가를 해결하거나 실천하는 학문은 아니다. 개인, 집단, 나아가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자 애쓰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이해만 깊게 한 채 잘못된 현상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학 같은 순수 인문학은 빛을 많이 잃고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면의 모습을 먼저 파헤쳐보고 분석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 분야에서 어떤 걸 깊게 고민해 알아낸 사람에게 해결책까지 고안하라고 맡긴다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닐까.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닐지, 그와 관련된 해결사 역할은 또 다른 분야에서 고민하고 애써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첫번째로 소개할 Si-Fi 소설인 "The Hunger Games"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데,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사회학적 애정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 책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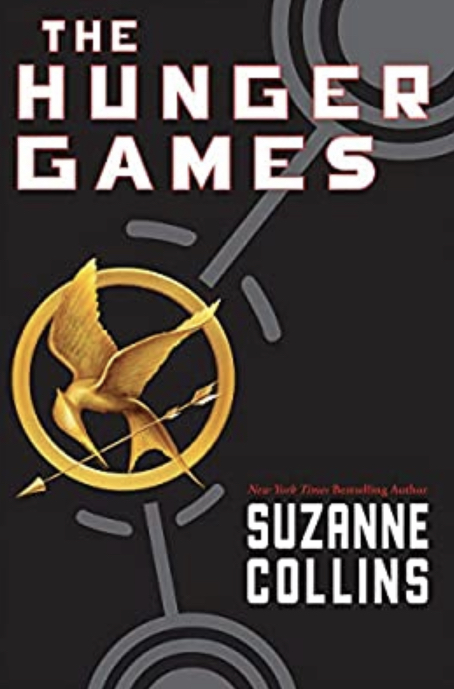
The Hunger Games (헝거게임)
미국에서 와서 초반에 읽었던 영어소설 중 어떤 책보다 좋아했던 책이다. 난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마지못했는데,이 작가가 진정 천재 아닌가 싶어서였다.
Suzanne Collins는 마치 "사회계층론"에 정통한 사람인 양, 10대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회 구조적 모순, 계층 간 갈등, 빈부 간 격차 등을 Si-Fi 스타일로 녹여내고 있었다. 재미도 있지만, 오랜만에 잊고 있던 작은 학문적 감성을 깨우는 작가의 상상력이 나를 흥분시켰다. 그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거의 손에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읽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전 시리즈는 Trilogy(3부작)으로 The Hunger Games 외에도 두 권이 더 있다.
Catching Fire(2권), Mockingjay(3권)는 1권처럼 전개가 긴박하며 끝까지 단숨에 읽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지는 않았고,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 Si-Fi 장르를 좋아한다면 1권인 The Hunger Games는 꼭 읽기를 추천한다.
단, 미국에서는 Young Adult 소설인만큼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중간에 나오는 싸움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소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보면 독재 치하 구역별로 뽑힌 대표자들의 생존게임이 벌어지는 게 전체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상처 및 무기와 관련된 낯선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다.
예컨대, pus: 고름, festering: (곪은) 종기, gash: 깊게 패인 상처, scythe: 큰 낫, trident: 삼지창, 등등이 기억난다. 책을 읽으면서는 대충 다친 상처겠지 하고 넘어간 후에, 한꺼번에 이런 단어들은 찾아보긴 했다. (너무 많이 나온다...)
영화는 4편(3편은 2개로 구성)인데 책보다는 그 박진감이 덜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Si-Fi/액션 영화를 즐긴다면 충분히 볼만한 영화라 본다. 특히 주인공들이 어린 배우들이라 발음도 또렷하게 잘 들리니* 재미있게 보며 듣기 공부도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대체적인 미국 영화 특성인데, 미국도 아역배우로 출발하는 배우들이나 젊은 배우들은 연기를 시작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미리 발음/화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 나이가 많으신 배우들은 개인별 특유의 발음(사투리/지역색 등)이 있지만, 젊은 배우들 발음은 대체적으로 전형적 미국인의 표준 발음으로 연기를 해서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더 잘 들리는 경향이 있다.
너무 흥분해 첫번째 소설을 길게 소개한 감이 없진 않지만, 그외 흥미로운 Si-Fi 영어소설과 영화 두 편을 더 소개해 본다.

Fahrenheit 451 (화씨451도)
화씨 451도는 책이 탈 때의 온도를 말하는데, 책을 모두 불태워버린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서정적인 문체로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게 아닌 책을 태워버리는 직업이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세계에서 모두가 TV에만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이 책은 읽기를 역시 강추하는 책이다.
영화는 책을 읽고 바로는 아니고 언젠가 넷플릭스에서 나왔길래 봤는데, 화제가 많았던 블랙 팬서(Black Panther)에 나왔던 마이클 조던(Michael B. Jordan)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는 1953년에 출간되었던 이 고전 소설을 굉장히 현대적 방식으로 보여줘 나름 볼만했다. 단, 영화는 몰입도가 있거나 썩 재미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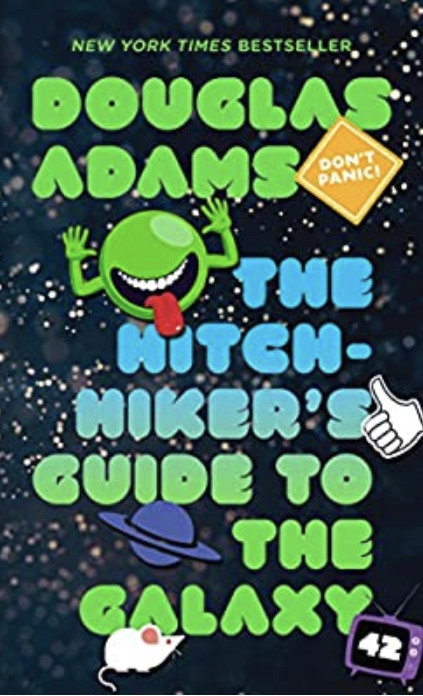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안내서)
이 책은 처음 읽을 땐 왠지 잘 안 읽혀 한동안 책을 덮고 있다가,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푹 빠지게 되었던 소설이다. 영국 작가의 소설인데,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베스트 몇 선 이런 걸 찾아봤을 때 그 리스트 속에서 발견하고 제목이 특이해 읽었다. 알고 보니, BBC 라디오에서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었던 그 원작 소설이고, 코믹 SF소설로 정평이 나있다고 한다. 나오는 소재들이 다 신박하며, 특이한데 1978년에 이런 소설을 상상해 쓴 작가의 기발함이 대단한 듯 하다.
셜록의 파트너 존 왓슨을 연기한 마틴 프리먼(Martin Freeman) 주연의 영화를 보면서 마치 만화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책에 나왔던 다양한 특이한 이름의 외계 생명체들을 직접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마치 해리포터 소설이 처음 영화로 나왔을 때, 그 기가막힌 소설이 과연 영화로 어떻게 그렸을지 영화를 보는 내내 소설과 대조해보며 보는 느낌이랄까. 액션 없는 재밌는 Si-Fi 영화로 강추한다.
'Stories of life - Books & Mov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넷플릭스 결혼이야기 영화 두 편 vs. 현실 속 미국 부부들 (16) | 2020.08.04 |
|---|---|
| 영어소설이 영화로 (2) 스릴러 (8) | 2020.07.18 |
| 영어소설이 영화로 (1) 로맨스/드라마 (8) | 2020.07.08 |




댓글